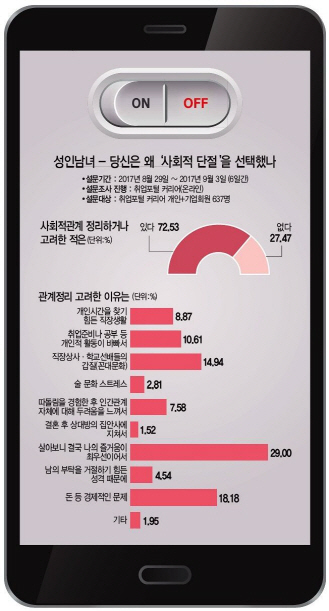마흔 살 김아무개의 ‘가상르포’
SNS 중단 나홀로 1박2일 살아봤더니
카톡 대신 글스기, 웹서핑 대신 음악감상
‘나’와 가까워진 24시간
이래도 되나→편하다→해방감 만끽→두려워졌다
자꾸 혼자 있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무 바쁘게 살았나. 눈·귀를 닫고 나홀로 방구석을 뒹굴다 보니 금세 혼자인 게 익숙하고 편해졌다. 꼬박 24시간이 흐르자 해방감과 섭섭함이 교차했다. 문득 이러다가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외부와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일순간 두려움이 밀려 왔다.”
△휴대전화SNS 차단해보니
직장인 김 아무개(40) 씨가 보낸 1박2일 간의 사회적 단절기(紀)를 축약하면 이렇다. 휴대전화·메신저를 비롯해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을 모두 차단했다. 이른바 ‘자발적 고립’을 겪은 뒤에 쓴 경험담이다.
언제부턴가 퇴근 후에도 SNS 호출이 관행화하면서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살던 김 씨였다. 단 하루라도 회사 걱정과 가족에게서 벗어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자각이 이번 선언의 출발이었다.
새벽 5시30분. 휴대폰 알람도 꺼졌는데 버릇처럼 눈이 떠졌다. 웃픈 직장인의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해도 보았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결국 밍그적 대다, 오전 9시 쇼파에 앉았다. “뭘 해야 하지?” 잠시 멍했지만 금세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팀장의 카톡이 울리지 않는다. 아, 살 것 같다. 동료의 얼굴이 스쳤다. 매일 아침 해장이 필요한 황과장과 늘 사표를 품고 다니는 유사원의 소심한 복수들이 떠올라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었지만 이 상황에 점점 만족해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먹지 않던 아침 밥을 챙겨 먹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겼다. 단식원이나 기도원이 이와 비슷할까. 말수는 줄고 반면 혼잣말이 늘었다. 킥킥, 웃음이 났다. 잠시 끝내지 못한 회사 일과 연락을 기다릴 거래처 공대리가 떠올랐지만 그만뒀다. 대신 먼지가 쌓인 CD를 꺼내 들었다. 행복하단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다. 가끔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오늘의 뉴스가 궁금해졌지만 참았다.
△하루100분 전화, 50건 문자서 해방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야근이 잦았다. 술자리마다 비혼인 나를 안주 삼았지만 그냥 웃어넘기는 일도 많았다. 매달 1500건, 하루 평균 50건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또 달마다 3000분 이상 통화를 했다.
훌쩍 낮 12시가 되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웠다. 사뒀다 읽지 못한 책을 꺼내 들자 잠이 들었다. 자괴감이 들었다. 오후 3시께 늦은 점심을 챙겼다. ‘칙칙’ 밥 뜸들이는 소리와 ‘펄펄’ 찌개 끓는 소리가 오감을 자극했다. 먹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입맛이 돌았다. 오랜만에 사진첩도 들췄다. 어릴 적 내가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닌가. 거울을 들여다봤다. 아이는 없고 중년에 접어든 아저씨만 보였다. 표정도 찬찬히 살폈다. 센티 해졌지만 외롭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퍽 마음에 들었다.
날이 저물자, 잊고 지낸 친구들 생각을 했다. ‘잘 지내느냐’고 안부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대학 친구들을 만난 기억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SNS 과시 글을 보며 남과 비교하는 자신도 싫었다. 말하고 싶은 욕구도 솟구쳤는데, 글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썼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인맥과 돈보다 중요한 게 현재의 삶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이 섰다.
철저히 외톨이가 되기로 한 은둔자들이 이해가 됐다. 그들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졌다. 나를 찾고 싶다는 ‘저항’ 같은 것이리라. 진짜 행복은 사회 안과 밖 어디에 있을까. 자꾸 혼자 있고 싶은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 글은 사회적 단절을 직접 경험한 이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한 가상 르포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